자신의 성질을 고집하지않고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不守自性隨緣成
이만큼 중요한 구절이 법성게에서 또 있을까!’ ‘자성自性'과 ‘수연隨緣’이 모두 나왔다. 자성은 자신이 원래 가진 고유의 성질이고, 수연은 주변의 조건을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본질을 인정하지만,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고유의 성질을 바꾸지 않고, 변화하는 조건에 따르는 것이 동시에 가능한가?
여지껏 신경써서 따라왔다면, 지금 분석하고 있는 대상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는 원리에 대한 것이라는 감을 잡았을 것이다. ⟪법성게⟫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은 아주 유니크 하게도 물리적인 대상이다. 모든 물질들은 성질을 지닌다. 물질적인 대상들에 대한 불교의 분석은 다른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대개 4대에 기반하고 있다.
지地의 단단한 견고성
수水의 촉촉하고 미끈한 습윤성
화火의 따뜻하고 뜨거운 온난성
풍風의 움직이는 유동성
그 이후에는 공간이란 물질을 합하여 5대가 되니 에테르란 공간물질을 제5원소로 상정했던 서구의 철학자들과의 생각과 비슷했던 것 같고, 이후에는 우리의 ‘인식’도 하나의 원소로 받아들여서 불교는 지수화풍공식의 6대설까지 발전시킨다.
원소라는 것은 사물의 기본물질을 상정하는 동시에 그것이 가진 특징이나 성질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질들의 조합으로 어떤 새로운 2차 물질이 탄생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본물질의 기본성질은 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본성질을 꽉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들과 어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얼음이 얼음의 모양과 차가운 성질을 유지하면 녹아서 물이되는 것은 어렵다. 얼음이 딱딱함, 각진 모양, 차가운 성질들을 버리면 고체의 얼음은 액체의 물이 된다. 끓는 물과 차가운 얼음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 물론 드라이아이스는 가능하시겠다.)
불을 가하면 네모난 얼음, 동그란 얼음, 살얼음은 모두 섞여 하나의 물로 완벽하게 바뀔 것이다. 반대로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은 섞어서 차갑게 얼리면 완벽하게 얼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새삼 할 필요도 없는 상식에 속한다. 만약 그 성질들이 고정불변의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물과 얼음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각자의 성질을 완전히 버린 것인가. 얼음과 물은 분명히 하나가 되었는데 뜨거운 물에서는 얼음의 성질을, 얼음에서 뜨거운 물의 성질을 발견할 수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 각자는 각자의 모양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고유의 성질은 고유의 성질대로 존재하지만, 얼음에서 뜨거운 물의 모습을, 뜨거운 물에서 얼음의 성질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체 그 뜨겁고, 차가운 고유의 성질은 어디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다는 말인가. 얼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 차갑고 딱딱한 성질은 어디에 숨어있다가 다시 얼었을 때 나오는가.
그렇다면 온도라는 주변의 조건에 따라 성질이 변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온도라는 조건’에 얼음과 끓는 물의 성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컵을 끓인다고 해서 끓는 물이 되거나, 빵을 얼린다고 해서 얼음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법성게⟫는 다르마가 가진 고유의 성질을 인정하면서, 조건에 의해서 그 성질이 절대로 정해진 실체는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자신의 성질을 가지면서 다른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 물리학이란 장르조차 없던 7세기, 의상스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 두 개의 단어, 자성과 수연으로 이루어진 구절은 불교철학에서 물질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즉 불교의 물리학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주요한 대목이다.
‘허무’라는 말은 불교와 별로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흔히 ‘허무’란 말이 ‘공’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불교의 지향점이라고 오해한다. 공이란 인도인의 관념으로 창조된 0이란 숫자를 중국인들이 번역할 때 쓴 글자이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의미는 '텅 비어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불교에서 ’공'이란 좀 더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다. 자신의 성질을 철저하게 가지고 드러내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면 물 자체에는 뜨거운 성질도, 차가운 성질도 없다. 하지만 차가운 곳에 가면 얼고, 뜨거운 곳에 가면 끓는다. 바로 어떤 특정한 성질이 있는 물질과, 동시에 그 어떤 성질이 표현되지 않고 어울려버린다.
물질과 실체없음, 색즉시공色卽是空이란 두리뭉실하게 '둘이 사실은 둘이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임'을 말했을 뿐이지만, ’불수자성’이란 자체적인 성질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자성자신만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인정한다. ‘고집하지 않는다’는 말은 고유의 성질, 자성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자성은 존재하지만 조건에 따라가서 완벽하게 조건에 연기를 맞추니까 '같은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를 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앞에서 우리가 본 육상원융 중 ‘총상’과 ‘별상’이 동시에 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논리학은 서구논리학의 언제나 사물은 그 고유의 성질을 유지한다라는 사물의 본성essence, ‘동일률’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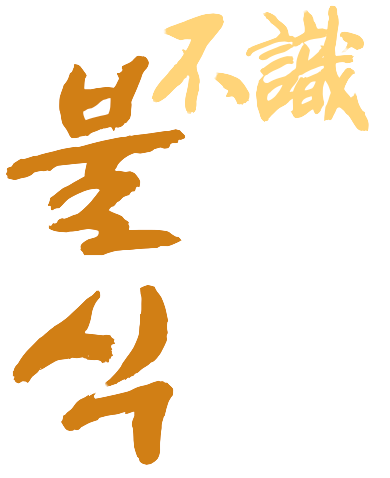
그 시절 물리학이란 개념도 없고 알음알음으로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그 시절엔 어떻게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관념적인 접근으로만 그렇게 했으니 대단하다고 봐야죠. 상상이라기엔 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기도 하고요 ㅋ 그런데 2000년 전 불교논사들의 물리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사실 좀 놀랍긴 합니다. 이를테면 소리의 영원성, 시간의 존재, 사물의 모양의 원자적 실체와 같은... 뭐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논의들이 방대한 자료로 남아있는데도 왜 불교도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의아심이라고나 할까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화풍의 4대는 많이 들어 알고 있는데 공간과 인식을 더해 6대설은 생소하네요^^
바라밀님 오셨군요^^ 그러실 겁니다. 인식의 통로나 인식자체도 현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각각 추가된 개념이라 조금 생소하실겁니다. 이렇게 또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