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一
하나속에 모든 것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그 하나입니다.
6상원융 중 전체總와 부분別과, 같으면서同 다른異 모습이 여기서 밝혀진다. 생물의 DNA에 대한 지식을 가진 우리가 오늘날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몇 백년전 사람들과는 달리 어렵지 않다. 손톱, 머리카락 하나에서 우리 몸 전체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으니 작은 한 부분에 전체가 들어있다는 말도 그렇게 놀랄만 한 사실은 아니다.
모르겠다. 두리뭉실과 애매모호가 역으로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던 동양의 사유를 가진 우리 선조들에게도 이 구절이 별로 어렵지 않았는지도.
전체와 부분이 사실은 나누어질 수 없고 같고 다름이 서로 통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궁즉통窮則通, 끝에 가면 통한다는 역설이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어쩌면 물리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했던 구절이었던 것은 아닐까.
여기서 1이란, 전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다르마, 더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단위의 물질, 즉 법(法)/다르마(dharma)이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근본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중(中)은 가운데라는 뜻은 꼭 아니다. ‘속’이란 의미, ~’에’란 장소의 의미도 된다.
7언절구 한구절에 상반된 의미를 다 넣었다. 다(多)는 전체이다. 뒷구에 나오는 일체(一切)와 같은 의미다. “다중일(多中一)” 전체, 혹은 모든 것에 하나가 들어있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뭐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들’이니 이건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 뒷구절은 하나와 전체를 아예 같은 것이라고 해 버린다.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다”
우리가 물리의 세계를 보기 위해선 관점, 즉 차원이 필요하다. 점을 잡아당기면 1차원의 선이 되고 선 전체를 가로질러 잡아 당기면 2차원의 면이되며, 면 전체를 늘이면 3차원의 입체가 된다. 2차원만 되어도 대개 한쪽면에서는 다른쪽 면을 볼 수가 없다. 입체는 말할 것도 없다. 한쪽에서 바라보면 반드시 사각지대가 생긴다.
물고기 눈(fish eye)란 카메라 렌즈는 사진을 찍으면 엄청난 화각이 나온다. 하지만 왜곡이 생긴다. 쭉쭉 뻗은 것들이 휘어져 보인다. 아마 물고기의 눈에는 사물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일까, 아니면 볼록한 렌즈의 모양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는 쭉쭉뻗은 사물은 제대로이고, 물고기 눈 렌즈에 찍힌 굽은 사물은 왜곡일까? 모든 객관 대상은 주관의 능동적인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 사물의 생김새의 좋고 나쁨이나 크고 작음에 대해서는 모두 보는 자가 어떤 잣대를 갖고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실은 무엇인가를 크다 작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류고 모순인지도 모르겠다. 절대의 세계에서 스머프의 다리는 결코 짧지 않으며 기린의 목은 결코 길지 않다.
그 길이가 길고 짧은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마치 우리의 뛰어난 지능의 힘인것 같지만, 그걸 길고 짧다고 판단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매우 기계적이 된다. 갖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반사적으로 길다 짧다를 판단하는 것이니 사실은 지능이 아니라 그만큼 비인간적일 때도 없다. 끊임없이 어떤 특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좋고 나쁨과 크기, 가치를 쉴새없이 계산하고 판단한다. 테잎으로 움직이는 핑퐁카가 앞을 받으면 뒤로 가다가 뒤를 받으면 다시 앞으로 가는 수준, 화장실 변기에 물이 빠지면 풍선이 떨어져서 물이 나오고 풍선이 물에 잠겨 올라가면 물이 안나오는, 결국 우리의 판단 능력이 딱 그정도다. 하나 더 있기는 하다. 우리는 누군가의 생김새나 길고 짧음에 대해 옆사람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다툴 수도 있다! 와. 대다나다.
본론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차원의 벽에 갇힌 시각으로 우리는 하나와 전체가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절대의 세계 - 절대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 완벽하게 객관적이면, 즉 주관만 배제해 버리면 그대로 절대의 세계이다. - 에서는 하나와 전체란 개념자체가 사라진다. 있던게 사라지는게 아니라 없던 걸 만든게 우리의 주관이기 때문이다. 굳이 상태와 패턴을 만들고 크기와 모양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고 분류한게 우리이기 때문이다.
관점이 사라지면 사각지대도 사라진다. 이쪽에서 보니 저쪽이 안보이는 것 아닌가. 결국 모든 것의 시작점은 주관이다. 주관의 한 가지 시점을 우기면 나머지 부분은 틀린게 되어버린다. 일중일체다중일은 하나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일즉일체다즉일은 결국 하나와 전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다고 말한다. 그럴법도 하다. 사실 현상계는 단 한 번도 전체와 하나로 구분되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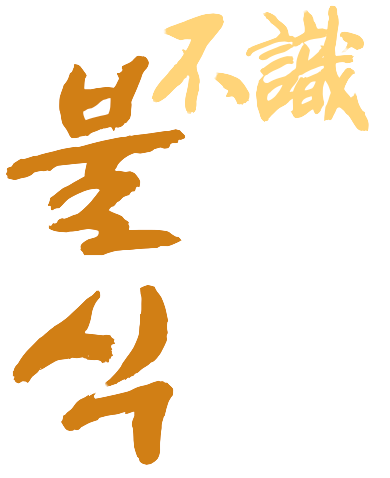
그 내려 놓음을 어떻게 알수가 있는건인지요? 그냥 내려 놓았다는 생각만으로는 진정한 내려 놓음이 아닐텐데 그건 마름 먹는다고 그냥 되는게 아닌듯 한데... 불식님은 어떻게 내려 놓으시는지요?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내려놓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거머쥐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획득하고 얻는 방법은 가르쳐 드릴 수 있으나 내려놓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등에 쥐고 계신 분도, 가방에 넣고 계신 분도,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으신 분도 있으니까 각자 쥐고계신 강도에 따라 내려놓는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혹시 내려놓고싶다고 말만 하면서 실은 내려놓기 싫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질문에 대한 직답을 드린다면, 내려놓았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놓고 나시면, 놓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진정 내려놓았냐 아니냐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내려놓는가 하면, 쥐고 있던 걸 놓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새 내 손에 와 있습니다. 놓는 것 보단 쥐는게 익숙한 우리니까요, 그럼 또 놓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릴 때까진 갈등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느 정도는 충분히 치열하게 씨름합니다. 하지만 결코 길게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10번만에 놓을 때도 있고, 100번만에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기억의 무대에서 필요없는 것들이 사라졌음을 발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이렇게도 봐도 되는지요?
넵! @himapan님. 안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다. ^^ 저희들이 너저분하게 퍼질러 놓은 말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셨습니다.^^
짱이십니다.
하나는 전체, 전체는 하나.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애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_^ ㅎㅎ
그렇습니까? 역시 툰 전문가시라... 옳은 말이라고 사료됩니당^^ 불경에 나오건, 애니에 나오든 말이죠^^
우리 스스로 주관적 시선만 내려놓으면 본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넵! ^^그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성이라는 부분이 가상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점을 유의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현상계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건 사실 수없이 많은 생성과 소멸, 분리와 합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일 때는 좀 더 본성적이고, 나누어질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에 대한 비판의 입장에서 한 언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