諸法不動本來寂
모든 다르마들은 처음부터
움직인적 없이 고요했습니다
無名無相切一切
뭐라고 부를 수도, 생김새도없으니,
모든 판단이 끊어졌습니다
다르마(법)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한 개의 다르마dharma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쪽이고, 어디서부터 저쪽인지 당최 구분이 불가능하다. 사실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편리한 생각의 방식이긴 한데, 문제는 모든 것이 그렇게 딱 구분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아니, 사실 구분이 가능한 것보다 구분이 불가능한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어떤 옳고 그름의 이성적인 구분이나 좋고 싫은 감정의 구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던가.
요리숫가락으로 정확하게 양념의 용량을 맞춰도, 불의 세기나, 재료의 상태나, 요리하는 이의 기분에 따라 100퍼센트 똑같은 맛을 낸다는 것이 어렵듯, 약간의 다른 조건이 주어지면, 이성도 감정도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처럼 현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상태는 다르마에서도 일어난다. 그리고 모든 다르마도 마찬가지다.
왜 움직인다, 고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그걸 다른 말로는 '작용’이라고 하고, 언어적으로 '동사’라고 표현한다. 일단 움직여야, 거기에 어떤 가치가 주어진다. 빠르거나, 강하거나, 멀리 가거나, 제자리를 빙빙돌거나, 이런 작용을 하면 그 작용에 따라 이름이 주어진다. 물이 하늘에서 구름의 상태로 있다가 물이 되어 떨어지면 그걸 '비’라고 부른다. 그 전에는 아마 '구름’이라고 불렸을 것이다. 같은 물질이라도 움직임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그 움직임으로부터 모든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르마의 작용은 처음부터 부정되어 버린다.
다르마는 원래 정해진 작용과 기능상의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다. 가만히 있던 존재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가만히 정靜과 움직임動’을 구분하지만, 다르마의 세계에서는 이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걸 구분하는 건 그냥 우리의 언어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축이 주어지지 않으면 동서남북의 구분이 불가능 하고, 진공상태에서 아래위를 구분할 수 없듯, 그런 구분들은 다르마의 세계에선 의미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 한 건 역시 '구분’하는 방식이니까, 구분을 해야 속이 시원해질 것이다. 그래서 굳이 부동不動이니 , 적寂이니 하는 뭔가 좀 우리 일상에 비해 조용하고 고요해 보이는 표현을 쓴 것이지 그게 정말 움직임과 시끄러움의 반댓말로 쓰인 것은 아니다.
구분이란 작용 그 자체가 바로 시끄러움이고, 부산한 움직임이다. 물 한컵이란 마치 컵에 담겨 있어서 그렇지 컵에서 꺼내 놓으면 정작 물의 모양이 어떻다고 표현할 수 없다. 그걸 컵에 부어놓으니까 컵모양으로 변한 것인데, 그럼, 물은 모양이 없으니까, '절대 모양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컵속의 물은 너무도 완벽하게 컵의 모양연기를 소화해 내니까.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부정적인 걸로, 고요한 건 긍정적인 상태로 x갑과 y값을 잠깐 제시해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자꾸 x와 y가 특정하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고 우기면 안된다. ⟪법성게⟫의 독자들은 그 고요함이란 것에 너무 몰두할 필요가 없다. 고요함이란 좋은 것이고, 시끄러움이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시끄러움이란 그냥 시끄러운 것이고, 고요함은 그냥 고요한 것일 뿐이다.
법法에서 불佛로 끝나는 ⟪법성게⟫를 읽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깨달음'으로 끝나니까 법성게의 법이란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성게의 첫글자 법은 사실 철저하게 현상事으로 시작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불경들과는 달리 ⟪법성게⟫의 원본인 ⟪화엄경⟫이란 책은 '현상'과 '이상'세계의 간극을 철저하게 부정한다. 그래서 진리를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라 물리, 즉 세속적이고, 현상인 세계 그대로가 완성된 진리의 세계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성게의 '법'이란 철저하게 현상세계에 대한 원자적인 분석이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불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환타지가 나오는 화엄경이나 법성게가 과학적인 비유가 잘 맞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의 존재를 최소한으로 쪼갠 원자, 다르마의 성격 중 하나가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다는 건데,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리방식의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세계의 다르마. 이걸 움직인다 어쩐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뭔가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 둘이 아니다란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고요하고 움직임도 없다고 하니 그것을 뭐라고, 어떻다고 규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모양도 파악이 안되고, 당연히 이름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 맞겠다.
'切'이란 우리말에서 긍정일 때는 '체’, 부정일 땐 '절’로 읽힌다. '모든 것' 일체一切라고 읽고, '전혀 없다'는 일절一切이라고 읽는다. 그러고 보면, 무명무상절 - '일체'는 무명무상절 - '일절'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모든것이 끊어졌다' 는 말은 더이상 우리의 언어가 진리는 고사하고, 물리적인 한계점에 가서도 이미 통하지 않는 도구가 되어버림을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없이는 생각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다. 그러니 우리언어로 다르마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판단을 유보하고, 다음 구절들이 법dharma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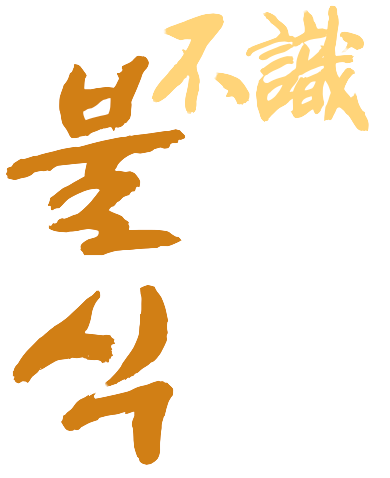
안주일체
안주일절
@himapan님 ㅋㅋㅋ
먹는거에 대입하면 다 말이 됩니다. ㅋㅋㅋㅋ
와 닿습니다. 그건 그냥 그것이지 좋은것 나쁜것은 나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니...
@gaeteul님 맞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것일 뿐이지요^^ 구독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