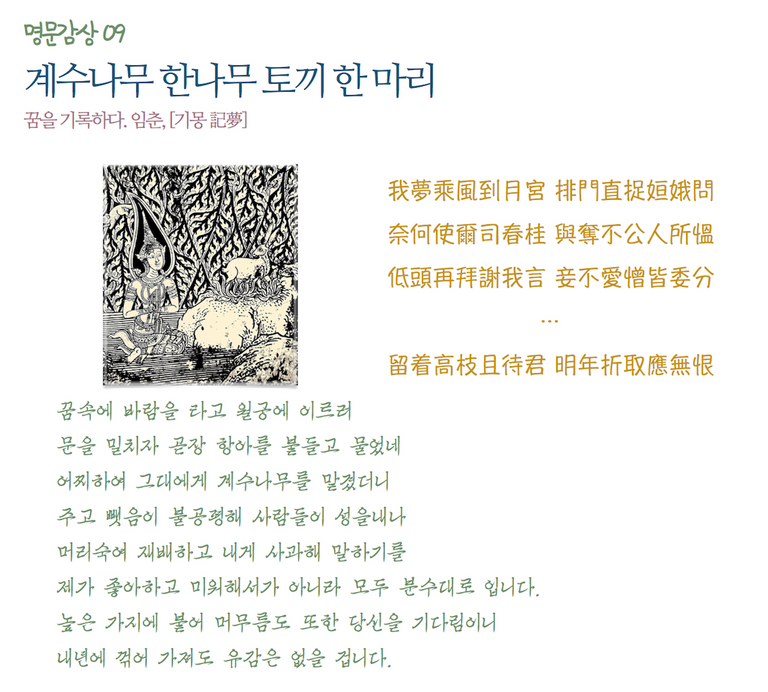
번역_정재서
고려시대 서하西河 임춘林椿(1147?~1197?)이 동양신화의 인물 항아를 소재로 자신이 시험에 붙지 못했던 사적인 한탄을 남겼다. 그 스스로 시에서 밝힌 것 처럼 30년간 이나 시를 짓고 활동했던 것 四海詩名三十秋 같은데 아마 끝내 시험운은 없었던 조금은 서운한 인생이었던 것 같다.
현대에는 7공주가 더 유명하지만 그래도 세속에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이상을 추구했던 청담파(그렇다. 잘 사는 이들이 사는 청담동과 같은 글자이다. 물론 기원은 다르지만...)의 가장 유명한 이들인 죽림칠현竹林七賢을 베낀듯 한 강좌칠현江(海)左七賢)의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재주를 펼쳐 보고 싶었으나 기록들에 따르면 그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40대의 젊은 나이로 떠나버렸던 것 같다. 그의 다른 시들도 이런 그의 한탄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그의 많은 글들 중 상당부분을 7현 중 한 사람인 이인로가 유고를 모아서 ⟪서하선생집⟫ 6권으로 출판했다.
불교와는 무슨 인연이 있어서인지 고려의 한 스님인 담인淡印이 항아리 속에 넣어서 서하집을 보관했다는데, 그것은 조선시대 청도 운문사의 인담印淡스님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었다.
꿈에 한 도사가 한 곳을 가리키며 거길 파보면 보물이 있을거라고 하여 깨서 파 보았는데, 거기에서는 동으로 만든 탑과 서하집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묻은 스님과 파낸 스님이 이름이 같으니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글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부처님전에 묻혀서 있다가 500여년 만에 나왔으니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면서 이익李瀷, 1681-1763)이 자신의 저술인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밝히고 있다.
항아姮娥 (혹은 상아嫦娥)는 동양신화에서 달에 사는 신이다. 활을 잘 쏘는 그녀의 남편인 예는 신이었다가 태양을 활로 쏴 버려서 미움을 받고 지상에 떨어졌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곤륜산의 서왕모에게 가서 불사약을 받아왔다. 불사약 복숭아는 3천년 만에 한번 꽃을 피우고 다시 3천년만에 열매를 맺는 귀한 것인데, 둘이 먹으면 불로장생하고, 혼자 두개 다 먹으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씩 먹고 불로장생 하기로 했다.
그런데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항아는 남편을 배신하고 혼자 다 먹고 날아올랐지만 배신한 죄로 신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만 같아 어두운 밤에만 활동하는 달로 도망가 버린다. 그녀가 남편을 배신했다고 하여 이후에는 남자들이 항아의 이미지를 흉측한 두꺼비로 모양새를 바꿔 달에 숨게 만들어 버렸다.
그들에 의하면 항아는 배신에 대한 상당한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달의 분화구들의 점들은 두꺼비의 못난모습 이라고 설명된다. 인도전통에서 달에 사는 동물은 두꺼비가 아니라 토끼다. 한 때 어떤 수행자가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가 굶어서 쓰러졌다. 원숭이와 늑대와 토끼가 이 모습을 발견했다. 원숭이는 나무를 구해와서 불을 피우고 늑대는 물고기를 잡아왔다. 하지만 토끼는 눈덮힌 산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다. 그러자 토끼는 원숭이가 피운 불 위로 뛰어들어 공양을 올렸다.그 노인은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이 숭고한 희생을 본 인드라는 토끼를 달에 보내서 토끼의 공덕을 오랫동안 기념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전통인 두꺼비가 아니라 인도전통인 토끼가 들어왔다. 달에 있는 것이 토끼든, 두꺼비든 아니면 둘 다 있든간에 역시 달에 전하는 전설은 ‘계수나무’다. 동양의 전통에서 ‘계수나무를 꺽는다’, 절계(折桂)는 월계관이나 시험에 월계수 무늬를 수 놓는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한다. 시험에 합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마도 동서양이 비슷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나보다.
임춘이 계수나무를 항아에게 맡겼는데 공정하게 주질 않는다는 말이니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불합격하고 왜 불공평하냐고 꿈속에서 항아를 붙잡고 따지는 것이다.
스스로 내년을 기약하려고 자신이 직접 쓴 글 귀,
“꿈속에서 내년에 그대를 위해 남겨둔 계수나무의 높은 가지”
를 임춘은 결국 꺽지 못했지만, 500년 뒤에는 조선의 한 스님과 걸출한 유학자인 성호에 의해 그의 존재가 소개되고, 또 오늘날 이렇게 회자되는걸 보면, 살아있을 때 임춘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별볼일 없는듯 했어도 천년을 살게 된 셈이다.
그러니 사람의 일이란 좀 잘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한 천년쯤은 진득히 기다려 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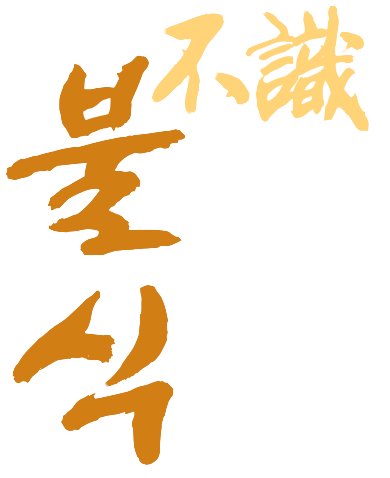
BULSIK / 명문감상
#008 "마치 등불이 꺼지듯 그의 마음이..." - 아니룻다, 부처님을 보내며
#007 "모든 경계가 사라지면"
#006 "당신이 지금 있는 그대로 부처님" - 무의자 혜심慧諶, “깨달음을 얻은이가 시를 보내왔기에 답시”
#005 "수행인가, 중생제도인가", 사명당 유정, 본법사의 섣달 그믐날 밤
#004 "진리에는 권위가 없다"
#003 "행복과 깨달음"- 한 비구니 스님의 깨달음의 노래
#002 "일곱걸음에 시를 지어라" - 조식, 칠보시
#001 "사랑도 미움도"- 나옹, 청산은 나를 보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중국은 달이 아니라 두꺼비이군요. 달은 농사에 참으로 중요한 기준이었던것 같습니다. 가끔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쳐다 보는 달은 그 모양새가 우리 나라에서 보던것과 다르다는것도 신기했었는데 나라마다 달 분화구 모양도 다르게 본다는것도 신기하네요.
@gaeteul님 방문감사드립니다.
@bulsik님 감사합니다. 늘 좋은 글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천년쯤 진득히 기다려 볼일이다! 기다리죠 뭐 그까잇게 뭐라고 못기다리겠습니까?
@himapan님 제가 감사드려야지요^^
@bulsik 님 주고받고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 항상 모든 글에 답을 일일이 다 달아주시고 즐거운 날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