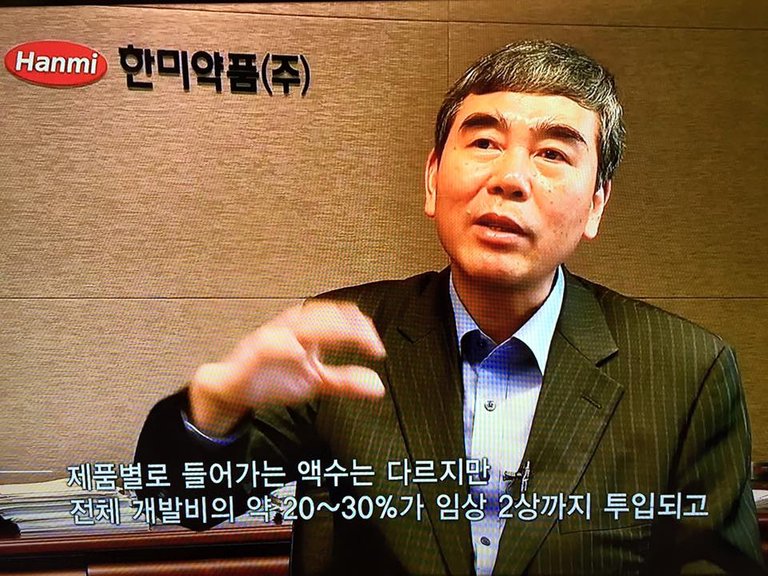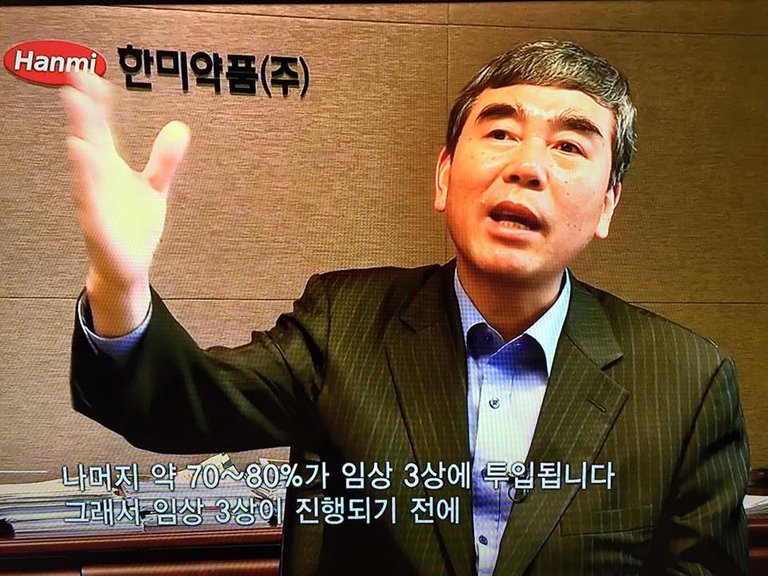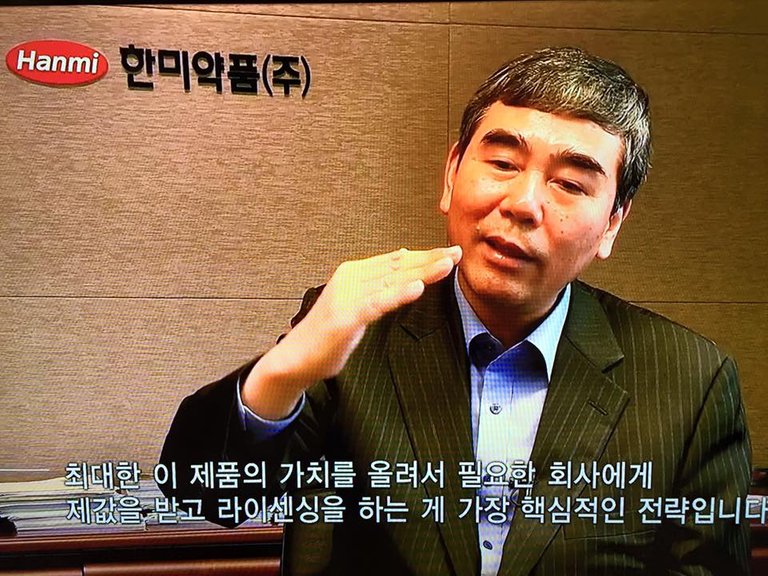스팀잇 아이디 개설 후 테스트 삼아 예전 글을 몇 개 올려봅니다.
2015년 11월 19일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한미 단상>
2004년 처음 제약산업의 혁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을 때, 11개 제약사의 연구소장을 인터뷰했다. 처음에는 우리 기업의 신약개발 전략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려다가 당시 신약개발연구조합의 회원사가 40여개에 불과한 것을 알고 그냥 전수조사를 해도 되겠다 싶어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런데 11개사까지 하고서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단했다. 모든 제약회사들의 신약 개발 전략이 동일했고, 그 외에는 다른 전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이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던 그 전략은 "2A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임상을 3상까지 완료할만한 자금이 없는 국내 기업들은 적정 시점에서 다국적 제약사에 라이선싱 아웃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좋은 전략인데, 인간에서 약효가 최초로 확인되는 임상 2A 단계가 비용 대비 수익면에서 가장 좋은 라이선싱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할수 만 있으면 최대한 2A 단계까지 진행하고 파는 것이 좋다는 것. 오늘 KBS 다큐에서 한미 이관순 사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전략이다.(아래 사진 참조)
당시 인터뷰한 소장님들 중 동아 김원배 소장님과 한미 이관순 소장님이 가장 말씀을 잘 하셨다.(두분 모두 연구소장 출신으로 사장이 된 공통점이 있다) 바이오 분야의 전공 배경 없이 처음 이쪽을 연구하기 시작한 나로서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모르는게 너무 많았는데, 이 두 분을 통해 큰 그림부터 사소한 디테일까지 내가 알고 싶었던 대부분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이관순 소장님은 3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사소한 부분까지 내가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답해주셨다.(다른 소장님들은 2시간 내외) 30대 중반 신참 연구자의 인터뷰에 그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성의를 다해 답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참 고맙고도 대단한 분이라 생각된다.(인내심이 대단 ㅎㅎ)
그런데 사실 그때 한미의 중심 전략은 1st 제네릭이었다. 인터뷰가 있었던 2004년 9월은 한미가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물질명 암로디핀)의 제네릭인 아모디핀을 막 출시해서 불과 3개월 사이에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시점이었다. 노바스크의 특허 만료 시점을 보고 2~3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20억 정도의 개발비를 들여서 불과 몇달 사이에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국내 시장에 발빠르게 제네릭을 출시해서 제네릭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한미의 핵심 전략이었다. 이관순 소장님은 신약도 하실거라고 하셨지만, 당시 내 느낌에는 그냥 시늉만 하는 정도로 느껴졌다. 이번에 기술이전된 랩스커버리 기술도 당시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DDS 기술 하나 하시는구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단, 인터뷰한 회사 중에서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제일 강하고 돈을 버는데는 매우 스마트한 회사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에 비해 동아는 당시에도 신약 개발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사실 임상 2A 단계가 가지는 의미를 포함해서 이러한 라이선싱 전략을 가장 잘 설명해준 분은 동아 김원배 소장님이셨다. 그리고 동아는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서 나온 물질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리뷰해서 자사의 파이프라인으로 들여오는 회사였다. 요즘 말로 하면 open innovation을 전면에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제약회사의 부족한 신약 연구 역량을 산학연 협력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얻은 물질을 임상 1상이나 2A까지 개발한 후에 다국적 제약사에 이전하는 모델이 국내 제약업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었는데, 동아가 바로 그런 회사였다.
재벌 계열사 중에는 LG생명과학과 (주)SK(현 SK바이오팜)가 신약 개발에 적극적이었고 유망해보였다. 그러나 두 회사의 문화나 전략은 매우 달랐다. LG는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더라도 자력으로 신약 개발의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나가면서 어렵게 역량을 쌓았다면, SK는 국내가 아닌 미국 뉴저지에 연구소를 먼저 세우고 미국 제약업계 출신의 교포 과학자를 소장으로 영입하는 전략으로 보다 쉽게 신약 개발에 접근한 것 같았다. SK는 미국에서 경력자들을 채용하고 중추신경계에 집중해서 연구를 한 결과 단 기간에 10여건의 FDA IND 신청을 성공시켰다. LG가 'from scrach' 전략이라면 SK는 'short cut'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2A 전략에 따라 유망한 후보물질을 발굴해서 임상 1상이나 2상 단계에서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이전을 하고, 그 이전된 물질이 FDA 허가까지 받아서 1조원 이상 팔리는 블록버스터가 되면, 우리 제약사는 매년 1~2천억원의 경상기술료를 10년 이상 받게 되는데, 이런 사례가 나오는 시점이 비로소 우리 제약업계가 글로벌화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어느 회사가 가장 먼저 이 2A 전략을 성공킬 수 있을지 전망하기가 어려웠다. 신약에 도전하는 회사들을 전통 제약회사, 재벌 계열사, 신생 벤처, 이렇게 3 그룹으로 나눈다면 각 그룹은 저마다의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쪽이 먼저 대박을 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단지 인터뷰를 다니면서 들었던 느낌으로는 SK가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신약 개발 역량을 축적하고 성과를 내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후 실제로 SK의 간질 치료제 후보물질이 임상 1상 이후 Johnson & Johnson에 이전되어서 3상까지 진행되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과민반응 문제로 중도 포기되었다. 그 약이 허가까지 갔으면 2A 전략이 제대로 성공한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2A 전략의 첫 성공 사례는 한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로서는 신약보다는 제네릭에 방점을 둔 회사라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의 결과이다. 다시 기억을 복기해보면 한미의 강점은 비즈니스 마인드였던 것 같다. 시장을 잘 주시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데 강점을 지닌 회사. (물론 이런 성향 때문에 영업이 너무 공격적이어서 눈총도 많이 받은걸로 안다) 언젠가 길리어드의 김정은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발표하실 때,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아이템을 잘 찾는 것이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기억이 난다. 그 때 예로 드신 것이 3가지 AIDS 약을 하나의 알약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었다. 과학적으로 아주 혁신적인 약을 개발하는 것은 연구자에게 매력적이지만 그보다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미가 이번에 성공시킨 랩스커버리 기술도 이런 범주에 속하는 것 같다.
이대로 한미의 제품이 시장 출시까지 성공한다면 국내 모든 기업들이 채택했던 2A 전략의 첫 성공사례는 한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국내 기업들의 여러 다양한 강점 중 결국 '시장 마인드'가 승리하게 되는 셈이다. 과연 어떻게 될까? 동아, LG, SK, 그리고 다른 제약회사나 벤처들도 늦지 않았으니 더 분발해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