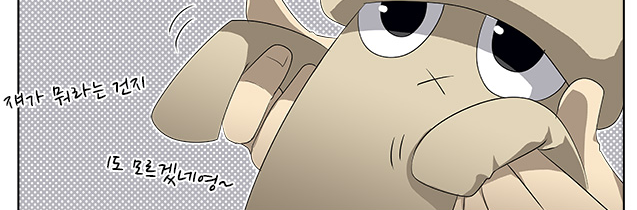어느 날 점심을 먹을 때의 일이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뭐가 좋아지는 건지 쉽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뭐가 좋아지는 건지, 쉽게……? 거 참, 이 추운 날씨에 이토록 진땀나게 만드는 질문이라니.
비교적 최근의 삶을 돌아보면,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그리 낯설지 않게 들린다는 게 실감이 난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워낙 밀도 있게 쓰고 들어와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만큼 그 개념을 명확히, 그리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글쎄, 얼핏 생각해봐도 그리 많지는 않을 듯하다. 그것은 곧, ‘대중화’를 논하기에 블록체인은 여전히 적지 않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 대중화? 음…… 제 점수는요.
블록체인이 화두로 떠오른 이후, 여러 가지 파생어와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블록체인을 키워드로 표방한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 등장했고,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내외 미디어도 앞다투어 생겨났다.
블록체인 낙관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연구와 논의를 거듭하고 갖가지 관련 행사를 여는 등의 노력은 늘 반갑게 보고 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숙하게 뿌리 내린 기존 인프라와 시스템을 대체하기엔 여전히 화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묻는다면, ‘대중의 관심과 지지’라고 답하고 싶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 좋은 서비스라 한들 그 수명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사람, 그리고 시장(Market). 나름대로 획기적이었던 아이디어들이 사람들의 관심과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해 사라져간 사례는…… 구태여 손꼽으며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가 아니던가.
블록체인은 획기적일 수는 있지만 솔직히 직관적이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혹은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려는 시도가 더욱 필요하다.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그로 인한 이점이 무엇인지가 뚜렷해야 한다.
실사용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내지는 분권화. 말로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오랜 시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타파하려는 시도다. 이밖에 블록체인 업계와 개별 프로젝트들이 강조하고 있는 다른 특징들도 마찬가지다. ‘혁신저항(Innovation Resistance)’에 따른 반작용도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 “아 몰라, 그냥 하지마.”
블록체인 관련 뉴스나 게시물을 읽다보면 하루에도 새로운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여럿 접하곤 한다. 그중에는 기술적인 우수함이나 향후 비전 및 로드맵을 보여주는 데 치중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물론 시간을 들여 관심 있게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의 시간이 오로지 블록체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결국 실질적인 소비자이자 수혜자는 대중, 즉 ‘기존 상식의 틀 안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블록체인의 개념과 표방하는 가치를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접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각의 프로젝트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선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기존에 비해 무엇이 달라지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면, 그 내용이 쌓이고 쌓여 블록체인과 일반 대중 사이를 연결하는 튼튼한 가교가 돼 주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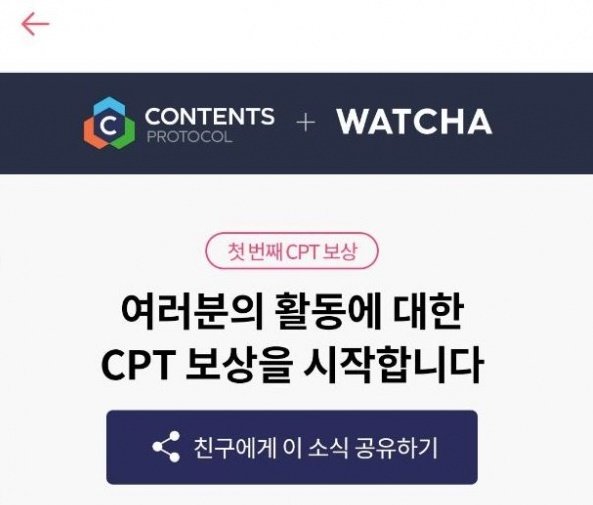
▲ ‘실생활에서 이득’을 제공하고 그 사실을 적극 어필하는 것.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접근이 아닐까.

▲ 뭐... 잘 다듬으면 마케팅 포인트로 쓸 수도 있을 테고. (a.k.a. '개이득')
만약 당신이 업계 종사자나 관계자가 아니면서 블록체인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또한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기술적인 개념이나 원리, 혹은 관련된 이야깃거리 등을 바탕으로, ‘일상적 흥미거리’로서 블록체인을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기존에 비교할 만한 사례를 들어 어떤 부분에서 편리해진다거나 하는 식의 이야기를 풀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들이 다시 관련 지식을 찾아보고 주변에 이야기를 전하며, 이른바 자발적 전도의 ‘체인’이 형성되는 식이다. 적어도 대중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신뢰성이나 보안성, 편의성 같은 ‘압축된 단어’로 장점을 부르짖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 백서는 물론 중요하지만… 대중의 관심을 얻으려면 다른 접근법도 필요하다.
( 이미지 출처 : 상단 - 깃허브 이더리움 백서 번역본, 하단 - 네이버 웹툰 <탈(TAL)> )
흔히,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든지, ‘기술과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없어야 마땅하다’ 라는 말을 쓰곤 한다. 허나 생각해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술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없었던 적이 과연 있었나 싶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장벽이 존재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치부해버리고, 그 장벽을 없애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 듯하다.
거의 항상 있어 왔던 기술과 사람 사이 장벽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마도 오만한 포부일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예전보다 높이를 낮추려는 노력까지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또 한 번의 산업혁명이 조금씩 구체화 돼 가는 지금. 블록체인이 진정한 의미의 ‘혁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돼야 마땅할 것이다. 과거에는 한없이 낯선 개념이었던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이 돼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블록체인은 ‘혁신적 발상’에 더해 ‘사람과 기술 사이의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다’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을 달고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