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릴 땐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 그저 따분하고 재미없는 것에 불과해 보였지만, 어른이 되어 현실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느끼게 된 건 그 평범이라는 것이 결코 얻어내기에 쉽지 않은 지위라는 점이다. 평범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경제 혹은 권력의 피라미드 그 중간 어디쯤을 평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모순되게도 모두가 말하던 평범함의 가치는 삶에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게 끝없는 욕심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
각자의 삶은 다 나름의 사정이 있고 팍팍한 일상이 존재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애달프도록 바라는 평범함일 수도 아무리 손 뻗어도 닿지 않는 신기루일 수도 있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어딘가에 속했지만 애매한 경계선에서 속했다고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와 지역, 성별, 나이 같은 대부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영역들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안과 밖을 구분 짓게 만든다. 주류에 속하고 다수의 것을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밖을 모른다. 꼭 그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밖을 인지할 기회도 필요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이라는 책에서 기시 마사히코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바로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강자보다는 약자가, 다수보다는 소수가,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그 경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그것을 더 인지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일정 부분 경계 안에 있던 내가 그 경계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것은 여행에서 책, 책에서 영화로 이어지는 경험 때문이었다.
오로지 휴양지로 선택했던 오키나와에서 나는 오키나와라는 섬이 과거에 독립적인 나라 '류큐국'에서 일본에 강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일상에 스며든 미국식 문화를 묘하게 바라본 적이 있다. 일본이지만 일본이 아닌 것 같고, 과거의 흔적이 뒤섞여 남아있는 그런 곳.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살아갈까. 내가 오키나와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겼을까?
제목이 맘에 들어 집어 든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이라는 책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사회학자가 만난 사람들과 경험했던 일화들을 묶어놓은 책이다. 주관적인 해석을 최대한으로 배제하고 마치 무의미한 부스러기들처럼 이야기들을 나열해놓았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여기서 평범함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영화 '가족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영화 '가족의 나라'는 재일 코리안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방북사업이 한창이었던 70년대에 아버지는 아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그렇게 25년이 흐른 후 어느 날 아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남겨져 살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과 까마득한 시간을 돌아온 남자의 모습에서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발견되는 듯했다. 물리적으로 어떤 나라와 지역에 속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인 소속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들의 일상을 그린 장면과 대사에서 그들이 어느 나라에도 완벽히 소속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범함과 특수성
단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평범하지 않다. 아니, 평범하지 못하다. 그들은 평범해질 수 있는 배경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계 혹은 바깥에 있는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안으로 들어올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평균값을 찾아 평범해지려고 노력한다. 비교의 기준은 저 멀리 떨어진 삶이 아닌, 내 주변의 삶들의 총합이 더 결정적이고 강력한 것이 된다.
하지만, 아무도 평범한 사람은 없다. 겉으로 평범함을 위장하는 웃음과 과시들은 많지만, 태풍의 눈과도 같은 평범 속에서 고요를 즐기는 사람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군가가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 같다. 어릴 때 느꼈던 그 따분하고 지루한 '평범함'에 대한 감각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평범하지 못한 양영희 감독은 가족의 실화를 담은 영화 '가족의 나라'를 만들어 각종 영화제를 휩쓸며 주목을 받았다. 그녀가 처한 상황과 배경의 안타깝고 슬픈 특수성은 그렇게 평범을 건너뛰고 특별해지는 경험의 재료가 되었다.
가질 수 없는 평범함 수 없는 평범함
평범함은 애초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평균치를 내봐도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쫓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 허상에 비슷하게 다가갔다고 할지라도 어딘가 또 금방 성에 차지 않는 느낌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우리의 삶도 어떤 식으로든 흘러갈 테니까.
가질 수 없는 것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쉽게 우울해지거나 불행에 빠지는 것 같다. 그렇게 평범이라는 신기루를 쫓으며 피곤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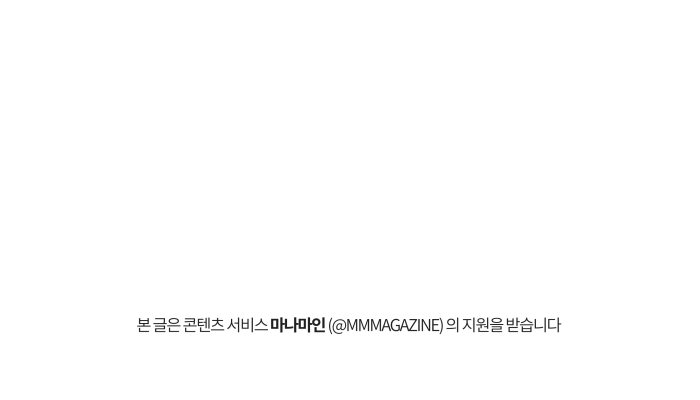
'평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평범하지 않다는 점이 재밌다는 생각을 한 적 있어요. '평범'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사회에서 다 다르고 특별하다는 점에서요. 다수가 영위하는 삶과 비슷한 삶의 모습을 누리는 정도로 본다면, 사회에 따라 '평범'의 수준은 천차만별이지요.
굳이 우리 사회에서 제시되는 평범을 쫓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수가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의 '평범'은 또 바뀌게 되지요.ㅎ
각자의 삶은언제나 다르고 개인마다 다른데, 평균치라는 기준을 자꾸 정하고 그걸 의식한다는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
평범하다는 단어가 폭력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글이네요! 요즘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찬찬히 그 의미를 살펴보고 사용해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단어에 대한 이미지도 다르고 맥락도 다르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같은 단어도 위로가 될 수도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