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5월 그때의 우리
아름다웠지, 우리
어릴때에는 세상의 모든 음악을 알고 싶었다. 호기심과 지적 허영, 그리고 강박의 조합이 나를 그렇게 몰아갔었다. 누군가 헨드릭스를 말하는데 내가 그의 음악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부끄러웠다. 그러면 내가 아는 음악 -대개는 재즈였다- 을 이야기하며 우쭐해하곤 했었다. 역시나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았다.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조금씩 아는체, 잘난체를 하며 지냈다. 누구는 영화로, 또 다른 누구는 고전 문학으로, 아니면 맑시즘으로. 어느 소설가가 말했었다. 이십 대에는 바위라도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하고. 나는 십대와 이십 대 초반을 세상의 모든 음악을 사랑하려 애쓰며 보냈다.
재즈를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음악을 좀처럼 듣지 못하게 되었다. 클래식 음악에는 재즈의 자유로움이 부족하다고, 팝은 재즈의 기술적인 면에 한참 못미친다고, 포크는 화성이 너무 단순하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너절한 한 명의 jazz snob으로 십 년도 넘는 시간을 보냈다. 중학교때 찰리 파커며 콜트레인을 들었다는 미국 친구들을 만나면 마음 한 구석에서 부끄러움이 일었다. 그 시절의 나는 비틀즈도 아닌 사이먼 앤 가펑클을 좋아했었으니까. The Boxer, Mrs. Robinson, Bridge over Troubled Water...
티비는 보지 않은지 십 이년째고, 라디오는 말할 것도 없다. 늘 커다란 악기를 들고 다니다보니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일 년에 몇 번 없는 일인데, 그때마저도 귀에 이어폰을 낀다. 스스로 찾아 듣는 음악 외에는 알 길이 없는 중년의 나는 늘 듣던 음악을 다시 반복해서 듣는다. 그러니 음악을 하며 살지만 정작 내가 연주하는 장르 바깥의 음악은 평범한 음악 애호가보다도 모른다. 그런 내가 강아솔, 하는 이름을 몇 번이고 들어보았다면 -백번 양보해도 최소한 그 장르 안에서는- 꽤 유명하다는 얘기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지난 주였다. 조금은 뜬금없게도, 그녀가 한 재즈 공연에 게스트로 참여하게 되었다. 뿔테 안경을 쓰고 기타를 메고 합주실로 들어선 그녀는 낯설음을 조금 불편해하는 듯했다. 툭툭 던지는 말을 듣자니 분명히 아는 말투인데 싶었지만 그게 누구인지 좀처럼 머릿속에서 찾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악기를 꺼내고 너무도 잘 알고 있을 자신의 곡을 반복해서 불러보고 있었다. 딱히 시선을 둘 곳도 없고 해서 그랬으리라. 아름다웠지, 하는 가사 첫 줄을 발음할때 아주 살짝 과장해서 아름다웠쥐, 라고 했다. 그 뒤에 깔리는 나일론 기타 소리가 좋았다. 제법 연습을 많이 한 소리였다. 그녀는 몇 번이고 코드 진행을 쳐보고 아름다웠쥐, 를 반복하며 합주실의 소리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노래를 할 때면 여지없이 눈을 감았다.
합주가 시작되고 나는 코드를 쫓아가며 정확하게 연주하려 했다. 목소리를 감싸고 싶어 둥근 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피아노와 드럼 사이에서 잘 섞여들고 싶었다.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자면 눈앞에서 노래를 불러주는데도 가사를 다 알아듣지 못한다. 하지만 어느 한 부분이 갑자기 내게로 성큼 다가왔다. 서로가 서로에게 당연히 여기던 마음이 돌연히 불안해져와, 하는 가사와 함께 마음 한 구석이 같이 휘청이는 기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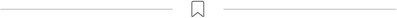
아름다웠지, 우리
아침햇살처럼 눈부셨지
아름다웠지, 우리
눈 덮인 숲처럼 고요했지
우리가 사랑한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당연히 여기던 마음이
돌연히 불안해져와
결국에 우리는
저무는 노을 빛에
석양이 되었네
좋네요..
서리우님 커버영상 고고고 ㅎ
나직이, 담담히 목소리를 감싸는 기타 선율 참 좋네요. ^^ 결국에 우리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 글도 좋습니다. 팔로우할게요.
제이미님 오마주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ㅎ
노래 좋네요. 이렇게 담담하게 툭툭 벹어내듯하는 노래는 참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목소리가 낯이 익은데 그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좋은 가수 소개시켜주셨습니다.
공연이 지난지 며칠인데도 계속 기억에 남네요. 다른 곡들도 몇 개 들어봤는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