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비트(wordbeat)는 노랫말에 대한 칼럼으로,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서울에 산 지 이제 10년째인데, 사실 지리적으로 경기도와 더 가깝기 때문에 딱히 서울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강서구에 살고 있다. 어릴 때는 경상도와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살았다. 그중 가장 오래 ‘머문’ 곳은 인천이다. 다니던 대학도 서울에 있지 않았으므로 서울 바깥에서 10대와 20대를 보낸 셈이다. 지하철이 있었지만 서울에 매일같이 오가기도 만만찮았다. 그래서 서울은 더 근사해 보였다(10층짜리 빌딩도 많고!). 그런데 서울로 이사를 왔더니 막상 남의 동네처럼 여겨진다. 요즘 가끔씩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단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Seoul Seoul Seoul]은 서울을 주제로 한 컴필레이션이다. ‘당신에게 서울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스물일곱의 음악가들이 음악을 실었다. 기존에 발표된 곡도 있고 신곡도 있다. 이 앨범을 기획한 라운드앤라운드는 ‘서울’이라는 주제로 작년 4월부터 여러 차례의 기획 공연을 진행했고 [제 1회 서울 레코드 페어]도 열었다. 이 앨범은 그 장기 기획의 하이라이트인 셈이다. 수록된 노래에선 한강, 이태원, 낙원상가, 영등포, 용산 전자상가 등이 등장하고 서울 아가씨, 지하철 2호선, 무허가 오두막(제목은 “무화과 오두막”)이나 오세훈 전 시장의 ‘디자인 서울’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도 담겨있다. 그중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의 “서울 사람”이 재밌다. 앨범의 첫 곡이기도 하다.
서울 사는 아저씨의 고향은 광주
서울 사는 아줌마의 고향은 대구
사울 사는 기사님의 고향은 강릉
서울 사는 이모님의 고향은 충주
그 좋은 데서 뭐 하러 올라왔어!
그땐 뭐 돈 좀 벌라고 그랬지
그래서 돈은 좀 버셨소?
어떻게 된 게 벌어도, 벌어도 모잘라!
서울 사는 노총각의 고향은 경주
서울 사는 대학생의 고향은 대전
나이 차고 너도나도 올라가는 통에 끼어
그 유명한 서울 맛 좀 보러 왔는데
장가도 못 가 취직도 안 돼
재미도 못 봐 내 집에도 못 가
서울 사는 뮤지션의 고향은 산골, 짝에 다람쥐
서울 사는 도우미 아가씨의 고향은 북쪽 너머의 북쪽
서울 사는 깍두기의 고향은 비린내 나는 어느 부둣가
서울 사는 사기꾼의 고향은 비밀
그래 서울 와서 꿈은 이뤘소?
꿈은커녕 죄만 짓고 사는 것 같어
다 잊고 고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아~쉬움 없이 내려가야 하는디!
내가 보고 싶은 곳은 이젠 서울 아니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이젠 서울 아니오
내가 놀고 싶은 곳도 이젠 서울 아니오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이젠 서울 아니오
서울살이의 기반은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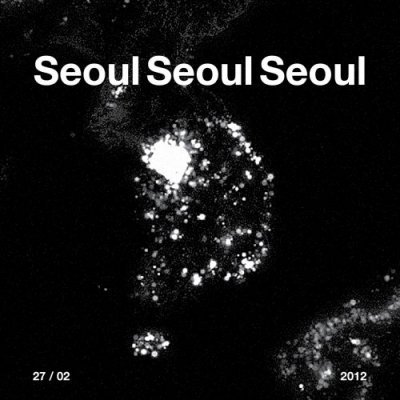
“서울 사는 아저씨의 고향은 광주, 서울 사는 아줌마의 고향은 대구, 서울 사는 기사님의 고향은 강릉, 서울 사는 이모님의 고향은 충주”라고 시작되는 이 노래에는 중간중간 “그 좋은 데서 뭐 하러 올라왔어?” “그땐 뭐 돈 좀 벌라고 그랬지” 식의 연극적 추임새도 등장한다. 트로트와 록을 긍정적으로 결합하려는 밴드의 지향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클리셰 같은 노랫말(내러티브)도 그 일환인 것 같다.
한편 이게 클리셰처럼 여겨진다는 점에서 흥미롭기도 하다. 이 노래를 한 마디로 압축하면 ‘서울에 산다고 다 서울 사람 아니지’ 정도일 텐데, 대도시 서울로 올라온 지역민들의 애환과 그리움은 ‘가요’의 오랜 소재기도 했다.
이런 정서는 몇 번의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조금씩 바뀌기도 했다. 식민시대에는 ‘억지로 시작한 타향살이의 설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주요한 내러티브였고, 한국전쟁 이후엔 ‘굳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정서’가 많아지기도 했다.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던 1970년대에는 ‘대도시 서울에 대응하는 이상향 농촌(시골)’을 그린 노래들이 많았고,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1980년대에는 ‘서울 찬가’류의 노래들이 대거 등장했다.
물론 이런 내러티브의 기반은 대부분 ‘각박한 도시생활’이라는 정서다. 특히 1994년 드라마 [서울의 달]의 인기는 1970년대의 정서가 1990년대에도 유효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서울 사람”의 노랫말도 마찬가지 같다.
이 노래는 서울에 대한 보편적인 인상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 그것은 2012년 이전에 발표된 드라마나 영화, 소설과 시를 통해서, 혹은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된 것이란 생각도 든다. 그래서 클리셰란 생각이 드는데, 놀라운 건 이 클리셰에 가까운 내러티브가 2012년 현재의 서울과 거의 완전히 겹쳐지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 사는 노총각의 고향은 경주/서울 사는 대학생의 고향은 대전/나이 차고 너도나도 올라가는 통에 끼어/그 유명한 서울 맛 좀 보러 왔는데/장가도 못 가 취직도 안 돼/재미도 못 봐 내 집에도 못 가”의 정서는 포털 뉴스에서 늘 접하는 사회면 기사의 압축판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노스탤지어도 있고 상실감도 있다. 그건 도시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 서울 중심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한국 사회의 ‘멘탈’을 건드리기도 한다.
한편 무언가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것이야말로 도시적 감수성일 텐데, 서울 사람의 삶은 안정된 정착민의 삶이 아니라 언제 여기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가깝다. 그러므로 서울은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머무는’ 도시다. 2012년의 서울 모습이 197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 일종의 비극일 것인데, 약 10년쯤 후에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의 “서울 사람”은 어떻게 기억될까. | 2012.03.24
Hi! I am a robot. I just upvoted you! I found similar content that readers might be interested in:
https://brunch.co.kr/@woojin/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