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션 - 과감히 덜어내는 힘
마이클 바스카 (지은이) | 최윤영 (옮긴이) | 예문아카이브 | 2016-11-17 | 원제 Curation: the power of selection in a world of excess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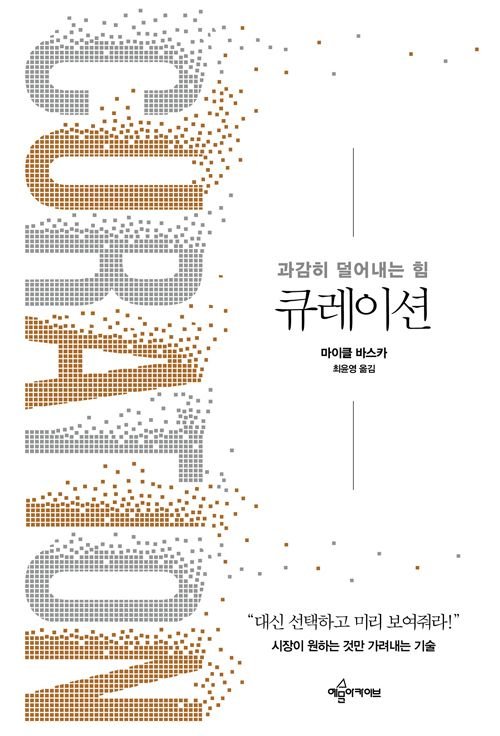
신간도서 리뷰어를 모집한다는 글을 읽고 신청을 했고, 2주 전 이 책이 집으로 도착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이런 류의 책은 어떤 범주에 넣어야 할까?
단순한 에세이나 수필집은 당연히 아니고, 처세술이라고 볼 수도 없고, 자기계발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언제부턴가 꽤 자주 듣는 용어 중의 하나인 큐레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에서 핵심은 이 부분인 것 같다.
<로마 정치에서부터 뉴욕 소변기까지> 라는 소제목을 가진 106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큐레이션의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단어는 사용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며 그 의미 역시 한층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큐레이션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 점점 그 범위를 확장해간다는 이야기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작가는 108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다른 많은 영어 단어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역사를 가진 채 계속해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한다. 단어가 의미 변화 없이 정체돼 있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이다. 따라서 큐레이션의 의미 역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의 과정을 거치리라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드농의 루브르 박물관, 뒤샹의 <샘>, 버너스 리의 웹 등 큐레이션이 놓인 맥락이 변화하면서 그 단어의 의미 역시 그에 맞게 대응과 확장을 거듭했다.”
사람은 무엇에든 의미를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내가 몇 년 전 우연한 기회에 배운 전각이라는 분야만 해도 그렇다. 작은 돌덩어리에 글자를 새긴다. 그리고는 그걸 전각이라고 부른다. 돌에 새긴 글, 그림을 전각이라는 범주에 넣음으로써 차가운 돌과 그 위에 새긴 무늬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어디 그 뿐이랴?
인간의 삶에서 “의미”라는 단어를 빼면 사실 남는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을 다른 생명체와 구분하는 잣대로 언어를 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의미부여하기”가 아닐까?
이 책의 94페이지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마르셀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이라고 알려진 남자 소변기가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남자 소변기를 마르셀 뒤샹이라는 사람의 서명을 넣고 작품이라고 부르고 나니 그 흔하디 흔한 소변기는 졸지에 엄청난 값어치를 지닌 작품으로 탈바꿈했다. 심지어 그 소변기는 철거예정이던 건물 화장실에서 떼어낸 거라던가?
더욱이 지금은 원작은 사라지고 복제품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복제품과 진품의 차이가 여기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부여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을 꼼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미술관, 박물관에서나 만날 수 있는 직업으로 생각한다. 아직은 이런 인식이 압도적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작가는 큐레이터의 의미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의미를 부여하고 정리하고 단순화하는 모든 작업을 큐레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심지어 슈퍼마켓에서 물품을 정리하는 일부터 기업체에서 신상품을 개발하는 과정까지 큐레이션의 범주에 넣어 소개한다.
이 책에서도 간혹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큐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큐레이션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쯤되니 이런 생각이 든다.
조금 과격하게 반대하는 기분으로 말하자면 적반하장이고, 좋게 보자면 원래 있던 것에 훨씬 더 긍정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니 금상첨화라고 할 수도 있겠다.
아마도 작가는 큐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갖는 확장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두툼한 큐레이션에 관한 책을 집필했을 것이다.
읽는 내내 ‘그럴듯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좀 심한데?“라는 생각이 번갈아 들었다.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대로 보자면 집 정리를 하고 책장에 놓인 책을 재배치하는 것도 큐레이션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니 말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큐레이션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한 확장되고 많은 산업분야에서 이 용어를 채택한다면 아마 이 책의 저자 마이클 바스카는 ‘큐레이션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한 선도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법 그럴듯한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치고 말겠지만...
이 책이 번역되어 내 손에 쥐어졌다는 이야기는 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반증일지도 모르겠다.
당장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 긍정을 하거나 부정할 생각은 없다. 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큐레이션이라는 용어의 사용범위가 얼마나 확장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이다.
57P
실상 우리 모두는 과잉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 문명화 된 현대사회에서도 빈곤의 문제는 심각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빈곤 문제는 절대적 의미에서의 빈곤은 분명 아니다. 상대적 빈곤이다.
106P
큐레이션의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단어는 사용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며 그 의미 역시 한층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 이건 어쩌면 이 책의 작가가 원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 않다면 작가가 이 책을 쓸 이유는 없을테니...
121P
큐레이션은 곧 선별작업이다. 또한 배치, 정제, 단순화, 맥락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얻은 건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누군가 내게 “큐레이터가 뭐하는 사람이야?”라고 물으면 대충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다. “전시장 꾸미는 사람 아냐?”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럴듯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141P
광범위한 선택 범위는 우리를 압도해 버린다. 올바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쉽사리 짐으로 느껴지곤 한다. 선택의 순간에 갈등하고 망설이는 것은 물론이다. 선택의 종류가 너무 많으면 결국 하나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 마지막 문장,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누군가 무엇이든 선택을 해야만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사회 곳곳에서 활기차게 돌아가겠지만, 요즘 우리나라처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딱 한군데로 쏠린다면 그 눈길 밖으로 밀려난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선택하지 않고 따라서 선택받지 못하는 고통...
153P
영국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은 수많은 소장품을 대상으로 큐레이션 작업을 진행한 덕분에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거듭났다. 이에 대해 19세기 영국 수학자 오거스터스 드 모건(Augustus de Morga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국 박물관을 생각해보자. 이곳에 있는 유물은 단지 박물관에 전시돼 있기 때문에 유명한 것인가? 원하면 요청하면 된다. 하지만 뭔가를 원하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우리말에 “아는 게 힘이다”라는 표현이 있다. 무조건 맞는 말이다.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무언가를 새로 배우려면 그 계통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의미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모르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Hi! I am a robot. I just upvoted you! I found similar content that readers might be interested in:
https://brunch.co.kr/@nozam/113
잘 읽었습니다.
특히 141P 부분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요.
책을 읽으면서 눈에 띈 문장을 소개하고 제 생각을 적었는데...
고개를 끄덕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