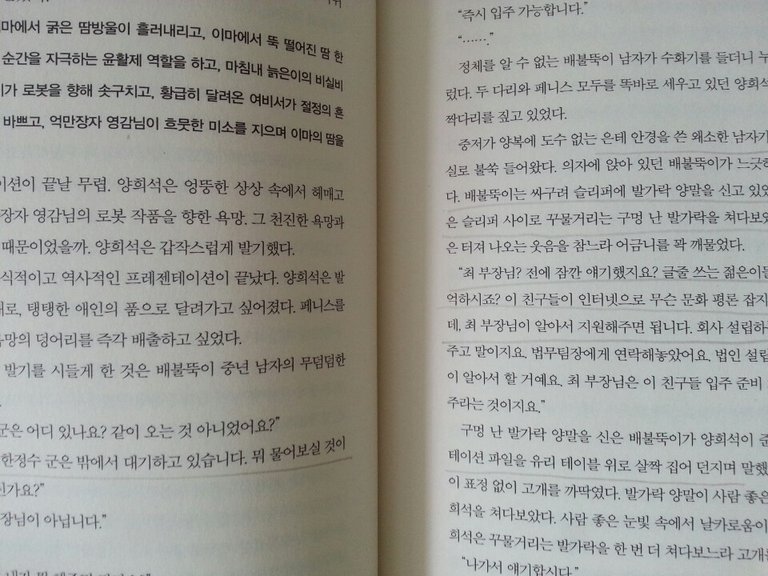
드디어 dot com bubble이 꺼지기 시작했고 우리 webzine도 모회사인 portal과의 content 공급 계약이 해지되었다. 새로 창간한 sex webzine에서 하루에 몇 만 원씩 유료 결재가 발생했고, 네이버에 조회수를 늘릴 abusing 기사들을 쓰며 하루 몇 십만 원 정도 받게 되었다. 문화 webzine은 아예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다.
월급이 안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남에 있던 회사가 분당으로 이사를 갔다. 당시 나의 집인 망원동에서 분당까지는 지하철만 타고 두 시간 반이 걸렸다. 아침 아홉시쯤 망원동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하염없이 동쪽으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다보면, 차량 안은 사람도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조명은 유난히 침침했으며 먼지가 많게 느껴졌다. 꼬박꼬박 졸면서 회사에 도착해보면 열두 시가 다 돼 있었다.
더욱 암담하게 느껴졌던 것은 내가 쓰고 있는 기사의 질이었다. sex webzine이든, 네이버 해외 news 기사든, 흥밋거리만 집어 내어 개수만 채웠다. 질을 높일 이유도, 의욕도 없었다. byline도 아무 이름이나 지어내 올라갔다. 그래도 한 번은 복날을 맞아 보신탕 풍습의 한국인들을 비하하는 미국인들의 theme forum을 발견해 기사화 했더니 몇십만 조회수를 달성해 갑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어느 날, 이럴 때가 아니다 싶어 정신을 좀 차리고, 정성을 들여 기사를 쓴 다음, 실명으로 byline을 넣어달라고 했다. 팀장은 “뭐, 실명을 넣어달라고? 헛, 웃기고 있어. 참, 나,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하며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잠시 그 앞에 있다가 한숨 한 번 푹 쉬고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비실비실, 회사 더 못 다니겠다고 힘없이 말했다. 팀장은 “그래, 출퇴근 시간이 너무하지...” 하면서 3개월 밀린 월급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새삼 부끄럽기라도 한 것인지... 어쨌든 나는 그에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한 달 내에 주세요. 일단 노동부에 신고는 할게요. 그런다고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야멸차게 말했다. 그런데, 그것도 회사라고 빨리 접을 생각은 없었던지, 놀랍게도 퇴사 3개월 내에 돈이 다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10년이 넘게 흘러,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그때의 낭인 팀장 중 하나가 당시 우리 webzine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세상에 대한 허세 가득한 저주와 여성 비하로 가득한 그 소설은 잘 팔리지도 못했고 그다지 잘 썼다고 볼 수도 없는 작품이었지만, 나는 책을 사온 그날 밤새워 읽고도 한 동안 여운을 가라앉히지 못하다가 다시 읽었다.
예전 팀장 세 명 중 한 명은 이미 알코올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후였고 소설이라 명명된 회고록은 그 도인 팀장에게 헌정되고 있었다. 모회사의 회장과 상무이사의 눈에 들어 회사를 설립하고 틀(?)을 만들어 나가던 초창기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세 팀장들이 문화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벌이던 술판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며, 회사의 소멸 과정으로 간략히 마무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를 포함한 팀원들은 단 한 명도, 단 한 순간도 등장하지 않았다. 우리는 extra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다. 하긴 나의 회고록도 온통 팀장들 이야기다. 생각해보면 우리 회사는 투자금을 받아온 자와 일하는 자로 정확히 구분돼 있었고, 주인공은 결국 투자금을 받아온 공로로, 일하지 않고 늘 놀기만 한 자들이었다.
이제는 소설가가 된 옛 팀장의 책날개에 인쇄된 작가 사진을 보며, 오래 전 그 시절의 그 남자를 떠올렸다. 늘 늦게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며, 별 말도 없이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 뭘 하는지 모르겠던 그 남자. 기사라고는 한 편을 제대로 쓰는 꼴을 보기가 힘들었던 그 남자. 그 동안 소설 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 우리 webzine에 올릴 글은 하나도 안 쓰며 보낸 그 무수한 시간 동안 그는 과연 습작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후에 써먹을 수 있도록 일기라도 쓰고 있었던 건지 궁금하다.
실은 나도 직장 이야기로 소설을 쓰고 싶었다. 꼭 이 직장은 아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써본 소설은 도저히 말이 되질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사석에서 몇몇 친구들에게만 들려주고 말기엔 아까웠다. 그래서 ficto-critical writings이라는 글쓰기 방식을 발견했을 때, 이거다 싶었다. 비판적 태도로 허구를 섞어 기록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