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슬(露)'로 만든 茶.
부지당(不知堂)의 茶 이야기 ( 12-1)
너무 오랜만에 차 이야기를 다시 쓸려하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글들을 살펴보 보니 나의 스승인 효당스님의 ‘반야로(般若露)’차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덕유산 모릿제에서 머물면서 벌렸던 전통찻집 강좌는 나에게 여러 가지 공부 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효당의 ‘반야로’ 차가 어떤 것인지를 다음번 강의 때 알려주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그것은 시간벌기였습니다.
모릿제로 돌아가면서도 효당이 어째서 자신의 차를 ‘반야로’라 했는지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기사 스님의 차 수발을 하면서도 행자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노동으로만 여겼고, 그의 차 생활에 관심이 없었으니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거창에서의 다도 강좌는 효당의 명성으로 강사료를 챙기고 있었으니 효당 차의 뜻 정도는 제대로 알려주어야 체면이 서게 생겼습니다.
이때 나는 불현 듯 ‘반야심경(般若心經)’이 떠올려졌습니다. 붓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불교의 핵심 법문(法文)으로, 이것에서 효당의 ‘반야로’가 탄생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 경전의 이름이 ‘지혜를 얻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色卽是空 空卽是色)
무안이비설신의 (無眼耳鼻舌身意)
무색성향미촉법 (無色聲香味觸法)’

살펴보면 색(色)과 공(空)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색(色)이란 보여지는 만물(萬物)의 형상(形象)일 것이고, 공(空)이란 그것의 본질을 뜻한다고 본다면 결국 ‘공’과 ‘색’이란 서로 같은 것이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형식(形式)’과 ‘내용’은 구분하는 분별심을 버리라는 가르침이었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눈을 갖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형식(形式)과 내용(內用)중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고 침을 튀기는 사람들의 뒷통수를 때리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어디 그 뿐인가요?
無眼耳鼻舌身意 (무안이비설신의)
無色聲香味觸法 (무색성향미촉법)
이것 또한 골때리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눈,귀,코,혀,몸 그리고 이를 통해 인지(認知)하는 모든 것들이 허상(虛像)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반야(般若)의 세계는 우리가 무엇에 매달려 목을 메는 삶의 형태에 대해서 정신차리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효당은 이 반야심경에서 ‘반야’를 차용하여 차를 마시는 행위가 반야의 세계를 깨닫는 길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진전시키자 비로소 효당의 차 생활이 보였습니다. 우선 그는 야단스럽게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거나 생각에 몰입할 때, 음악을 듣는 것처럼 차 생활을 했었고, 거기에 매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승려가 불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매달리는 것을 정도(正道)라 할 수 없습니다. 효당 역시 수행자였습니다. 따라서 색향미(色香味)를 따지는 ‘다도(茶道)’에 매달리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고, 단지 생활 속에 식음료를 마시는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초의(草衣)의 차 생활은 ‘끽다거(喫茶去)’라는 화두(話頭)를 잡고 깨달음의 방편으로 삼았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비로소 효당이 왜 자신의 차(茶)를 ‘로(露)’ 즉 ‘이슬’이라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강의할 날자가 되었습니다. 강의장에 도착하였을 때 주인장은 빨간 오미자 차를 대접하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는 두 명이 더 참석했다며 싱글거렸고, 내심 강의가 재미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교실로 들어간 나는 약속했던 대로 효당이 자신이 만든 차를 왜 ‘반야로’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내 나름대로 해설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스님이 자신의 차 이름 뒤에 ‘로(露)’자를 붙였던 것인지를 물어 왔습니다.
“‘이슬(露)’은 밤의 음(陰)기운이 만들어 낸 물방울입니다. 이것은 해가 뜨게 되면 사라지고 마는 존재입니다. 실체가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 유(有)와 무(無)가 공존하고 있는 실체가 ‘이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색즉시공(色卽是空),공즉시색(空卽是色)의 결정체가 바로 이슬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설명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학생 한명이 그럼 효당과 자신들의 행다법(行茶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분의 행다법에는 일정한 형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한 량의 차를 다관에 넣고 물을 부어 차를 우려 마셨을 뿐이지요.”
“.......”
학생들은 모두 멍 때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비싼 수강료를 내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배우고 있느냐고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효당의 제자로써 이들에게 전해줄 다도의 형식이 없다면 당시 이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게 아니라 한 사람이 불만을 터트리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효당 스님에게 다도의 형식은 없었다는 말인교?”
“있었습니다. 자 모두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차를 우려내 보세요.”
내 지시에 따라 모두 차를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 바라보며 효당의 행다법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 거기까지!” 그들 모두에게 동작들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행위들이 모두 형식적이고 인위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당신들처럼 부자연스럽게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동(動)과 정(停)의 순간이 물 흐르듯 나누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한 학생의 다판을 가져다가 직접 보여주면서 동(動)과 정(停)은 음양(陰陽)의 흐름처럼 긴장(緊張)과 이완(弛緩)의 조화(調和)를 의미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자연(自然)의 흐름은 긴장과 이완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인간 삶의 노동과 휴식으로 교환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건강한 삶도 이같은 상태를 유지할 때 얻어질 수 있다는 진리를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삶은 병들 수 밖에 없다는 이치도 여기에 있겠지요.”
난 효당의 제자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그의 ‘차도’를 열심히 설명해 주었을 때, 학생 한명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모리거사님은 차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까?”
이 질문은 완전히 내 기(氣)를 죽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 인생길마저 바꾸게 만들었으니 삶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여행길이 틀림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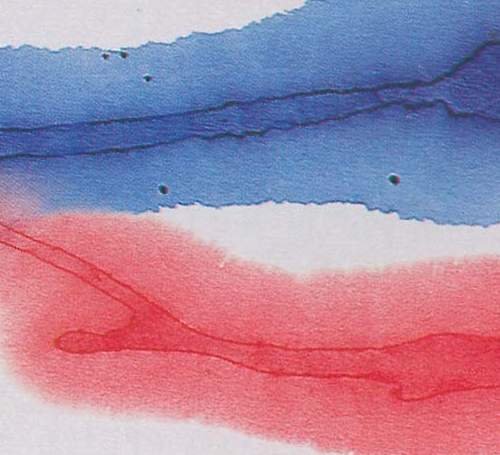
좋은 아침. 저는 코박봇 입니다.
보팅하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