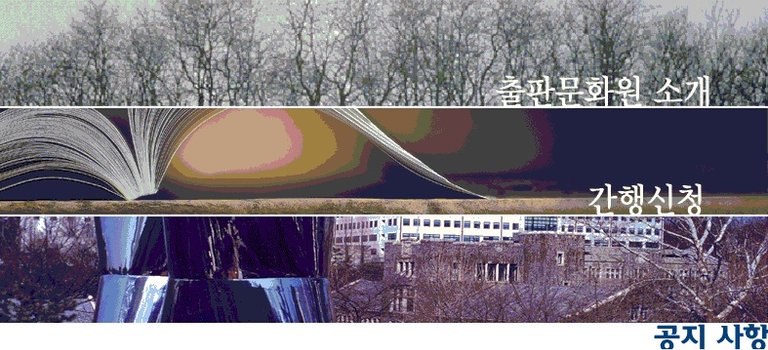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글을 쓰는 게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나 보다. 몇 달이 지나도록 다음 편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세 번째 직장의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나서 다음 직장 이야기로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이제야 기운을 냈다. 그런데 이번 직장에 대한 글은 여섯 편으로 써야 할 것 같다.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기억하는 일이 많아져서일까?
나는 이번 세 번째 직장에서 처음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았던 것 같다. 그 전 두 직장에서도 갈등은 꽤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젊은이들의 연애처럼 풋풋하고 귀여운 다툼들이었다. 낮에는 울고 불고 했어도 밤에는 비교적 잘 잘 수 있었다.
그러나 성희롱이 포함된 이번 직장에서의 갈등은,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 hell gate가 열린 것 같았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 것은 물론, 매일 지옥 같은 기분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왜 그런 기분 있잖은가. 종일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피부 위에서 스멀스멀 느껴지고 하루하루 멍하니 부유하는 좀비가 된 기분 말이다.
물론 내가 맡은 일은 차질없이 진행해 나갔지만, 출판부 남자 직원 넷은 중요한 일들에서 나를 조심스레 제외시켜 나갔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 달력 만들기'였다. 그 어느 출판물보다 많은 부수를 찍으니, 출판부의 연중 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부서에서 그런 일을 하는 데, 나만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건 달가운 일이랄 수 없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 뻔히 보며 모른 척하는 것도 어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뭐, 어차피 되도록 서로 얼굴 마주하고 얘기할 기회를 줄이는 게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좋았다.
그리고 달력 만들기가 그렇게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아니었다. 날짜와 연중 행사 목록만 잘 챙겨넣으면 되는 일이니까. 그래도 남자 넷은 모여서 쑥덕대며, 온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꼴을 보면서 피식 비웃을 때가 더 많았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완성된 달력이 수십만 부 찍혀 나오던 날, 제작에는 왕따를 시켰지만 내게도 몇 부는 주어졌다. 씁쓸한 마음으로 두터운 종이에 인쇄된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나는 10월달에서 문득 멈췄다.
10월이라는 한글 옆에 굳이 집어넣은 영어 단어의 철자가 좀 이상했다. Octobor. 뭔 o자가 이리 많지? 영어 사전을 찾아보았다. October. 오타가 난 것이다.
100만부까지는 아니어도 10만부는 너끈히 찍었을 텐데... 물론 아무리 조심을 해도 오타는 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인쇄물을 찍을 때는 최대한 cross check, 즉 여러 사람을 거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실수를 없애야 한다. 그런 일을 아마추어나 다름없는 3인과 이제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은 노년의 편집자 1인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으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부장은 풀썩 주저앉아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끄으으윽 하는 신음 소리를 냈다. "왜 이런 오타가 났지???" 전부 다시 찍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고소한 웃음을 흘리며 모른 척 퇴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