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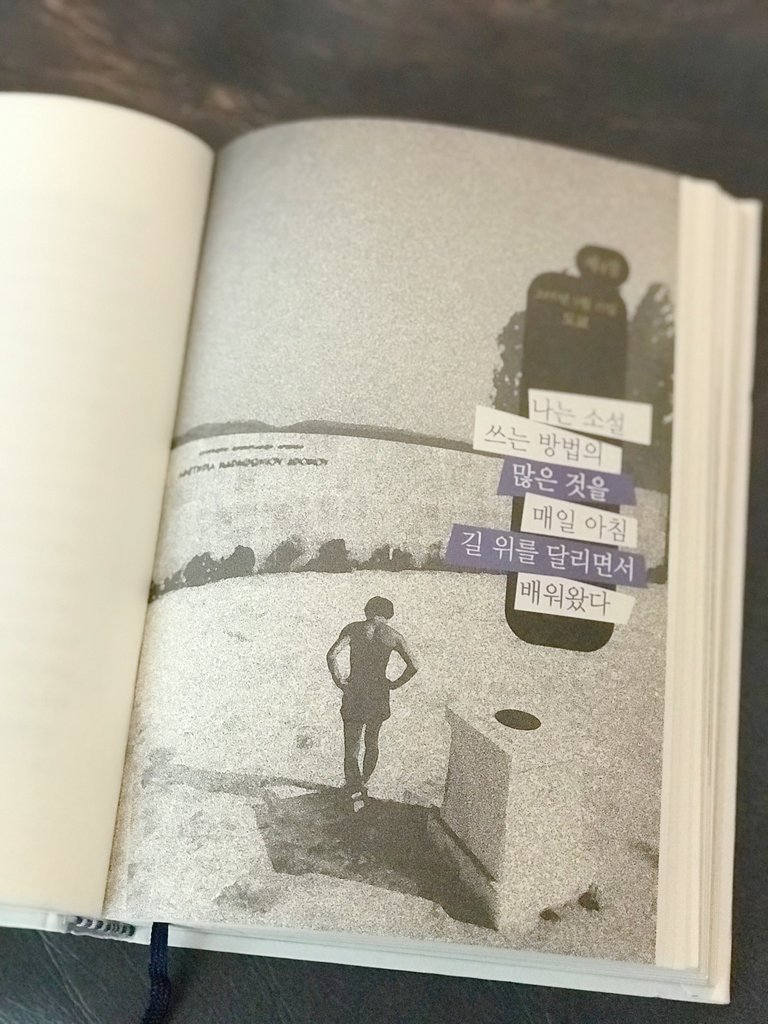
스물 세 살에 베이스를 처음 치기 시작했으니 늦어도 단단히 늦은 셈이다. 가끔씩 스무 살 쯤에 베이스를 치기 시작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다른 악기를 하다가 베이스로 바꾼 경우다. 나도 십대에는 기타를, 이십대 초반에는 피아노를 조금씩 쳤지만 푹 빠져있던 취미생활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음악이 업이 되리라고는 내 스스로도 믿지 않았다, 매일 밤 상상은 했을지언정.
피아노를 훨씬 더 좋아했었다. 스무 살 언저리쯤, 김현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 게스트로 나온 재즈 피아니스트가 “재즈 피아노를 하려면 클래식도 많이 쳐야 하나요?” 하는 질문에 “아뇨, 클래식은 체르니 30번 정도만 치면 돼요.”라고 답하는 걸 들었다(지금의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나는 바이엘 하권부터 치기 시작했고 체르니 100번을 거쳐 30번에 도달하는 데에 이삼 년이 걸렸다. 매일 저녁 시간이면 다니던 동네 교회로 가 빈 성가대 연습실을 찾아 피아노 연습을 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다음날 학교에서는 줄창 엎드려 잠을 잤다.
어찌어찌하면 체르니 30번이야 끝마칠 수 있었겠지. 하지만 안 될 것 같았다. 세상에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나는 고작 체르니 30번을 가지고 낑낑대는 중이었다. 즉흥연주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었다. 12번 곡을 치고 13번 곡을 연습하다가 ‘체르니는 이제 그만!’ 하고 덮어버렸다. 재즈 피아니스트, 내겐 가능한 꿈이 아니었다.
피아노가 아니면 뭐라도 상관없었다. 드럼을 조금 쳐 보니 이건 정말 내 악기가 아니란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베이스, 이건 어릴때 기타를 치던 게 있어서 좀 친숙한 느낌이었다. 싸구려 악기를 하나 구해 연습을 해 보니 할 만 하다 싶었다. 주변에선 베이스를 치면 최소한 굶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거면 됐다. 무슨 악기든 상관없지, 음악만 할 수 있다면(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지긴 했다).
한동안은 숨가쁘게 성장했다. 학습능력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도 강했으니까. 재능은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제법 재능이 있는 편이라 믿었지만 그건 동호회에서 축구공 좀 차는 수준이나 다름없었다. 음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도 재능이 없는 사람은 드물었다. 하지만 재즈를 연주하는 이들이 별로 없어서 조금만 연습을 하고 나면 이내 연주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적당히 운이 따르는 시절이었다. 남들보다 십 년 늦게 시작했다면 십 년 뒤에 성취하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다다르자 영원히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시절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워낙에 하루키를 좋아했었기에 하나하나 그의 소설을 순서대로 쫓아가며 반복해서 읽었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1974년의 핀볼>, <양을 쫓는 모험>, <댄스댄스댄스>....물론 <상실의 시대>는 훨씬 이전에 읽었지만 그때는 오히려 감흥이 없었다. 30대에 이르러 갑자기 그의 소설에 그야말로 꽂혀버린 뒤로 몇 년 간 하루키의 모든 소설을 읽고 또 읽었다. <해변의 카프카>만 빼고 -그건 이상하게도 읽히지 않았다-. <스푸트니크의 연인>, <도쿄기담집>, <태엽감는 새>,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 <지금은 없는 공주를 위하여>, <중국행 슬로보트>,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1Q84>, <색채를 잃은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기사단장 죽이기>......
소설 이외의 에세이도 거진 다 읽었다. 출판사들이 바뀌며 중복되는 책들도 있고 중간중간 누락되는 것도 있으니 다 읽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루키의 에세이들은 워낙에 슥슥 읽히는데, 읽다보면 중간중간 피식하고 웃고 있거나 나도 모르게 아하 혹은 흐음, 하는 감탄사를 내곤 한다.
그런데 이 책,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는 조금 달랐다. 무겁지 않은 진지함이 있었다. 다른 에세이들이 종종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유머러스한 표현을 집어넣곤 했는데, 이 책에서는 서문에서만 잠시 조크를 던지고 만다.
4장에 가면 불쑥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 작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으로. 그는 첫 번째 자질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재능이라고 못박는다. 이는 전제 조건에 가깝다고. 나는 음악을 할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뚜욱, 하는 소리를 내며 몇 센티미터 정도 떨어진다. 도대체 어느정도의 재능을 가진 이라면 저 이야기를 읽으며 끄덕끄덕, 과연 그런거였지, 저 양반이 뭘 좀 아는데, 하며 태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재능의 양과 질을 개인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건 하루키도 안다. 그리고는 집중력과 지속력을 나머지의 자질로 꼽는다. 자신 역시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라 집중력과 지속력을 가다듬으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재능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고 한걸음씩 나아간다는 건 동의한다).
그렇게 계속 파내려가다보면 언젠가 땅 속 깊이 숨어있던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때도 있다고 했다. 어쩌면 그게 내가 꿈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딱히 눈에 보이는 재능이 없다는 것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오십이 될 때까지 계속 땅을 판다면, 저 아래 어딘가에 무언가 파묻혀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만약 다 파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할까. 지독히도 성실하게 땅을 파고 난 뒤 아, 여기엔 금맥이 없었군, 하지만 이쯤하면 좋은 인생이었지, 하며 바지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버릴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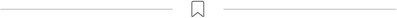
서문에 있는 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optional이라는 문장을 좋아합니다. 역자는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하기에 달렸다'라는 의미라고 번역했지만 그 번역은 딱히 마음에 들지 않구요. 저라면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하기에 달렸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책 한 권을 번역하는 일 따위는 하고 싶지 않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책의 맨 마지막입니다.
...(중략)...만약 내 묘비명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문구를 내가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써넣고 싶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그리고 러너)
1949~20**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이것이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인생중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도 흔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찾았다고 하더라도 재능, 명예, 돈이라는 것이 함께 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지요.
결국에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귀결되는군요. 自足하는 삶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누구도 제 마음을 대신해줄 수 없기 때문이겠죠. 참 좋은 구절이네요. 외워둬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번 읽고 마음에 새겨둔 문장입니다. 힘이 되곤 하는데, 자주 까먹는게 문제일 뿐이죠 ㅠ